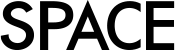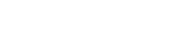「SPACE(공간)」 2025년 4월호 (통권 689호)

리우지아쿤 Image courtesy of The Hyatt Foundation / 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웨스트 빌리지(2015) 전경
3월 4일, 리우지아쿤이 프리츠커 건축상의 54번째 수상자가 됐다. 2012년 왕슈에 이어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두 번째 중국 건축가로, 중국 건축의 세계적 흐름을 각인시키게 됐다. 1999년 중국 청두에 지아쿤 아키텍츠를 설립한 그는 중국의 철학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을 통합하며, 집단과 개인을 오가는 접근 방식을 탐구해왔다. 리우지아쿤에게 정체성이란 특정 장소에 대한 집단적 소속감을 의미한다. 그는 중국 전통을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아닌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루예웬 석조조각 박물관(2002)은 기존 식생을 보존하고 건축 안팎에 자연 요소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수천 년간 이어져온 중국 전통 정원의 형태를 현대적 공간으로 재해석한 사례다. 송양 문화지구(2020)는 전통 유산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탁월함을 보여주며, 티엔바오 동굴지구 재개발(2020)에서는 산악 지형의 고저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특정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작업마다 새로운 시나리오를 찾아가는 것이 그의 건축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리우지아쿤의 작업은 단지 지역의 풍광에 어울리는 형태를 넘어 실천가로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그는 2008년 쓰촨 대지진 이후 폐허에서 나온 잔해를 지역에서 생산된 밀과 섞어 ‘부활 벽돌’을 개발했다. 기존 벽돌에 비해 내구성과 경제적 효율이 높은 이 벽돌은 수정방 박물관(2013)과 상하이 노바티스 사옥(2017) 등에 사용됐으며, 단순 재사용을 넘어 건축이 지역사회를 치유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줬다. 그의 초기 작품에서 지적되는 일부 시공 디테일의 조악함은 그가 지역 농민들을 직접 건설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실천적인 의미에서 건축의 풍부함을 추구한 것이기도 하다.
리우지아쿤은 자신의 접근 방식에 대해 “건축은 지역 사람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시화해야 한다. 건축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소성과 공동체에 대한 그의 관심은 밀집된 도시환경에서 공공 공간을 창출하는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작인 웨스트 빌리지(2015)는 하나의 도시 블록 전체를 차지하는 규모의 작업이다. 지면에서 들어 올린 경사로와 함께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배치하고 내부는 대담하게 비워내 중앙 정원을 조성했고, 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공공 집회 공간을 마련했다. 하나의 건축물이 인프라, 경관, 공공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준 사례다. 이에 2016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이자 심사위원장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현대 도시에서 기능이 분리되는 현상을 언급하며 “리우지아쿤은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해 도시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섬세한 균형을 유지한다”고 평했다.
올해 봄, 아부다비에서 리우지아쿤의 수상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이후 가을에는 온라인으로 시상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간서가에서 서울대-목천 강연 시리즈로 발행한 『리우지아쿤』(2019)에서 그의 주요 작품에 대한 소개와 국내외 학자들의 비평을 만나볼 수 있다.

▲ SPACE, 스페이스, 공간
ⓒ VM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