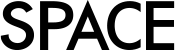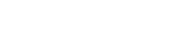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설계안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서울시의 발표 이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관한 주민 공청회, 토론회, 포럼 등이 자주 개최되고 있다. 2019년 12월 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광화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광화문 일대의 미시적 경험과 역사를 조합하여, 광화문을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자는 내용의 기조발제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발제자인 송은영(성공회대학교 교수)은 현재 광화문 경관의 기틀이 마련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인문, 사회, 생활사 등의 맥락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육조거리 같은 거대서사에서 벗어나 모빌리티, 젠더 및 페미니즘, 직주근접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광화문에 대한 연구시각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부 토론 순서에서는 염복규(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백영(광운대학교 교수), 박현욱(서울역사박물관 부장), 황두진(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백영란(역사책방 대표), 박찬희(박찬희박물관연구소 소장)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다. 황두진은 1부 발제자인 송은영이 남긴 연구과제를 상기시키며, 사대문 안의 상주인구를 관점으로 광화문 일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대문 안의 인구가 20~30만 명대로 줄어들었지만, 1970년대부터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오피스 외관의 도심형 공동주거가 늘어나는 현상을 예시로 들었다. 박현욱은 광화문이 공론의 장이 된 이유를 인근 선술집과 다방, 학교와 학원가 등으로 설명했다. 그는 광화문 일대에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계층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았고, 학생이 쉽게 군집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백영은 1968년과 1995년을 광화문광장이 무대적 장치로 전환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1968년의 광화문은 지하도 조성과 노면전차 철거로 지상 공간이 비워지자, 위인의 동상을 나열하는 국가상징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1995년도에는 중앙청 건물이 해체되면서 광화문의 축, 경복궁 복원 등 여러 공간적 변화가 논의됐다. 백영란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초점을 맞춰, “박물관의 공간구성과 전시 형태가 달라져야, 시민들이 광화문을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희는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는 광화문광장과 공간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한성백제박물관과 몽촌토성을 사례로 들며, 박물관이 주변의 물리적인 자원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광화문광장 일대 ©Kim Yeram

토론회 ‘광화문: 공간, 역사, 기억’ 현장 / Image courtesy of NMKCH
▲ SPACE, 스페이스, 공간
ⓒ VM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