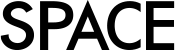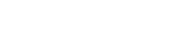「SPACE(공간)」2023년 1월호 (통권 662호)

오래된 동네에서 새롭게 지어질 건물은 과거와 어떤 접점을 가져야 할까. 프로젝트는 기존 건물의 요소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연결할 것인가를 찾으며 시작됐다. 도로에서 어떻게 진입했으며 담장은 어떤 역할을 했고 건물의 외장 재료가 주는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지붕의 형상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전 주인이 가꾸던 정원과 식물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새로운 건물의 설계는 기존 건물의 기억을 은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억과 존재
건물의 첫인상은 꽤 오래 지속되곤 한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많은 사람의 기억에 누적된 결과가 아름다움, 쾌적함 같은 동네의 분위기와 연결된다. 건축에는 계획에서 전달되는 물리적 질서, 텍토닉의 기술적 관점, 대지의 형상에 얽힌 지리적 과정, 내면의 감성을 드러내는 감정적 서술, 그리고 사용자나 경험자의 심리가 고려된 풍부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중 지리적 과정과 감정적 서술은 이전 건물과 새로운 건물을 잇는 중요한 연결점이다. 기억은 누적된 힘으로 다가오는 경험 형식이다. 오랫동안 동네를 지켜온 개체들에 담긴 기억은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한다. 기억, 지식, 상상, 감각 등의 모든 것이 별개가 아닌 전체로, 그리고 몸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몸과 마음, 감각과 분별력을 잇는 통합적 이해라고 부르려 한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무의식적 기억’이 순수한 형상을 솟아나게 한다고 믿었다. 과거를 삽화적으로 그리거나 서술하는 의식적 기억과는 반대다. 무의식적 기억은 현재와 과거 중 어느 것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도구로, 현재와 과거의 감각을 결합하며 새로운 형상을 창조한다. 우리의 일은 그 새로운 무언가를 이용해 현재와 과거의 감각 사이에 울림을 만드는 것이다.
관계의 미
건물의 직접적 ‘현존’이나 과거와 단절된 ‘현재성’은 아름답지 않다. 미의 본질은 시간을 초월하며 일어나는, 농축된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는 사물과 표상들 사이의 연결이다. ‘삶 자체가 하나의 관계망’이라고 주장한 프루스트는 “삶은 사건들 사이에 끊임없이 새로운 끈을 연결하고”, “이 끈을 두 배로 늘려 과거의 모든 지점들 사이에 풍성한 기억의 망을 형성함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갈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다양한 갈래의 가능성을 포함한 계획은 앞으로 축적될 기억에 풍성함을 배가한다. 연결성이 없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경험은 낯설기만 하다. 공간적 낯섦을 상쇄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도구는 이전부터 몸으로 경험했던 ‘기물’들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던 가구와 조명, 그리고 다양한 사물들이 공간에 어떻게 배치되고 기억을 연결할지 고민하며 공간을 구체화해 간다. 프로젝트는 건축주가 사용하는 1층의 사무실과 임대를 위한 2, 3층의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건축주가 거주하는 4, 5층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된다. 1층 사무실과 주택에 사용할 가구와 집기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배치와 재료 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기존 가구들이 새로운 공간에 밀착된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조율해갔다. 오버사이즈로 제작된 가구들에 맞춰 1층 사무실 공간의 크기를 조정하고, 건축주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가구들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중성적 공간을 계획했다. 각 기물에 저장된 이전 삶의 경험과 새 공간의 연결은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자 관계망을 확장하는 동력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미적 지점이다. 건물의 중앙에는 계단이 위치한다. 각 층의 근린생활시설이 유동적으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4층과 연결되는 계단은 외부를 통해 일하는 공간과 주택을 다시 한 번 분리한다. 계단과 복도는 단순한 코어 방식이 아닌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동선으로 계획해 공간적 전이가 일어나도록 했다. 입면의 창을 최소화해 다소 폐쇄적이지만 안정감을 주는 건물의 인상은 건축주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건물_ⓒa round architects



빛의 포착과 경험
지나가는 자의 순간적 경험과 머무르는 자의 누적된 경험. 건물을 경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나가는 자를 위한 외부에는, 빛이 표피에 달라붙는 듯한 표현으로 찰나의 질감을 포착한다. 외장재는 기존 건물의 화강석 석재 쌓기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어두우면서 질감이 있는 적층 스플릿 벽돌을 제작해 사용했다. 날씨에 따라 습기를 머금기도 하고 빛의 방향에 따라 질감이 강조되기도 하면서 건물의 인상은 시간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반대로 머무르는 자는 누적된 시간 속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채취한다. 상층부의 주택에서는 박공지붕의 고측창을 통해 유입된 빛이 3개 층을 관통한다. 이는 때때로 북쪽의 어둠을 밀어내기도 하고 정적인 내부에 리듬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공간이 빛을 담는 그릇이 되어 내부의 공기를 머금는다. 옥상으로 가는 길의 테라스는 외부 공기와 맞닿아 식물을 돌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기능한다. 내부의 따뜻한 빛은 외부에서 읽히는 단단함과 대비되어 더욱 온기가 느껴진다.
시적 은유화
기억 없이는 창조 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 기존 건물과 기억의 흔적에 따라 연속된 구성으로 재구축해 대지가 가진 가능성의 영역들을 발견하고 수용 한계를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던 특징 중 도로에서 집으로 접근하는 입구의 위치와 방식, 도로에 위치하던 주차장 셔터, 지루한 담장의 기억, 오래된 화강석의 적층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마당을 감싸고 있던 식물들의 대비, 마지막으로 예리한 각도의 지붕 형상은 새로운 건물을 계획할 때 유심히 느끼고 연결하고 싶었던 기억의 단서들이다. 기존 건물에서 보인 인자들이 새로운 건물에서 경험을 연결하고, 도로에서의 분위기를 바꾸며, 지붕의 형상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은유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건축 과정에서 은유는 내러티브의 연결로부터 시작된다. 은유는 사물과 사건들 사이의 대화를 만든다. 건물을 관계망 속에서 은유화하는 것, 다시 말해 시화(詩化)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시적인 시선은 종종 사물들 사이의 숨은 연결을 발견해낸다. 미는 결국 관계의 결과이다. 어쩌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이전의 감각들이 새롭게 재해석되어 그 자리를 지킨다. 다시 오랜 세월이 흐르면 이 역시 동네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글 박창현, 진행 윤예림 기자)


▲ SPACE, 스페이스, 공간
ⓒ VM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이라운드건축(박창현)
고상미, 최윤해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64.06㎡
94.83㎡
327.87㎡
지상 5층
3대
19m
57.8%
199.85%
철근콘크리트조
흙블록
노출콘크리트, 석고보드 위 페인트
건축구조연구소 다우
(주)코담기술단
라우종합건설(주)
2021. 3. ~ 9.
2021. 10. ~ 2022. 5.
조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