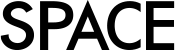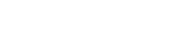「SPACE(공간)」 2024년 10월호 (통권 683호)

굳이, 에이코랩
‘굳이’에는 장음이 없다. 하지만 굳이를 발음할 때는 ‘구-지이’라고 길게 발음해야 제맛이다. ‘구’를 길게 끌수록 애써 일을 만들어 고생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길 수 있다. 4년 만에 에이코랩건축사사무소(이하 에이코랩)의 프레임을 진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굳이를 연발했다. 최소한의 건축적 개입, ‘건축가 없는 건축’을 표방한다는 이들의 언명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외양과 달리 에이코랩의 건축은 ‘대단한 건축적 의지’의 산물이다.
2013년 에이코랩을 개소한 정이삭(동양대학교 교수)은 평범한 서사들, 주변적이고 방치되거나 이형적인 것들을 포용하는 태도로서 ‘나머지론’을 역설했다. 그런 그의 작업은 주류 건축계의 그물망을 빠져나가, 사람들의 평범한 욕구를 세심하게 발굴한다(「SPACE(공간)」 634호 참고). 선언문(manifesto)이란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려는 강력한 의지로 쓰이기 마련이며, 이러한 건축적 의지 표명을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 에이코랩의 작업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짓는 일에 회의를 깔고 있는 ‘나머지론’이라는 정이삭의 선언은 스스로도 모순의 경계에 있으며, 그 논리와 결과물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역시 피하기 힘들다.
홍진표(에이코랩건축사사무소 대표)와 함께한 지난 4년의 결과로 이번 지면에 소개되는 작업들은 소규모 리모델링이 주를 이뤘던 이전에 비해 좀 더 규모가 있는 건축으로 이동했다. 덕택에 어렴풋했던 나머지론을 구현하는 방법론을 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정이삭과 홍진표는 “값싸고 흔한 재료에 정성을 들여 기존과 차이를 가지는 보편적 가치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의 지반을 찾았다고 설명한다.
건축계의 별종 같지만 에이코랩의 작업 태도는 최근 한국 건축계에서 보이는 모종의 흐름과 닿아 있다. 일례로 중소도시포럼(이장환, 이상현)은 제도권의 연구에서 배제된 소위 ‘덧대기 건축’ 현상을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분석하며, 비공식 영역에서 생산되는 덧댐의 언어가 쇠퇴하는 중소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말한다(본지 124~131쪽 참고). 건축업자의 언어에서 보편성과 합리성을 읽어내고, 도시ㆍ건축의 논의로 끌어들이려는 태도는 “건축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만들어내는 조형의 감각과 질서들을 누군가가 흡수해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건축사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에이코랩의 출발선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비평가 현명석이 짚어내듯 “정이삭은 좋은 건축 교육과 실무를 경험한 솜씨 좋은 건축가이며, 여전히 현장이 중요한 건축 생산 체계 속에서 그의 건축 작업이 여타 이른바 ‘집장사’의 작업과 같을 수는 없다.”(「건축평단」 23호 참고) 일례로 1970년대 지어진 주택을 리모델링한 N작가 주택(2024)은 집장사 주택의 외양과 문법을 이어받으며 연희동의 풍경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굳이 산 넘어 재개발 현장에서 기존의 것과 똑같은 벽돌을 찾아내 엉겨붙은 모르타르를 일일이 털어내고서는 고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쌓아 올린 수공예적 노력의 결과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나머지(들)에 대한 독특한 인용의 감각을 선보이는 건축가 김광수, 서재원, 김효영처럼 전유, 전용의 기술로 리사이클링해 병치의 수사로 형식화하지도 않는다”(위의 책 참고)는 박영태(동양미래대학교 교수)의 관찰, 혹은 원시적 조형 감각과 적정 기술이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있기에, 앞서(2024) 같은 작업을 떠올리면 에이코랩의 건축적 좌표는 더 혼란스럽다.
그런데 바로 그 모순과 난독이 굳이 에이코랩의 작업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하는 힘이다. 옛 철학자는 모순은 대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차이를 다루는 상상을 통해 창의성을 자극한다고 했다. 자, 이제 윤승현(중앙대학교 교수), 김광수(스튜디오 케이웍스 대표)가 함께하는 비평과 대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편집장 김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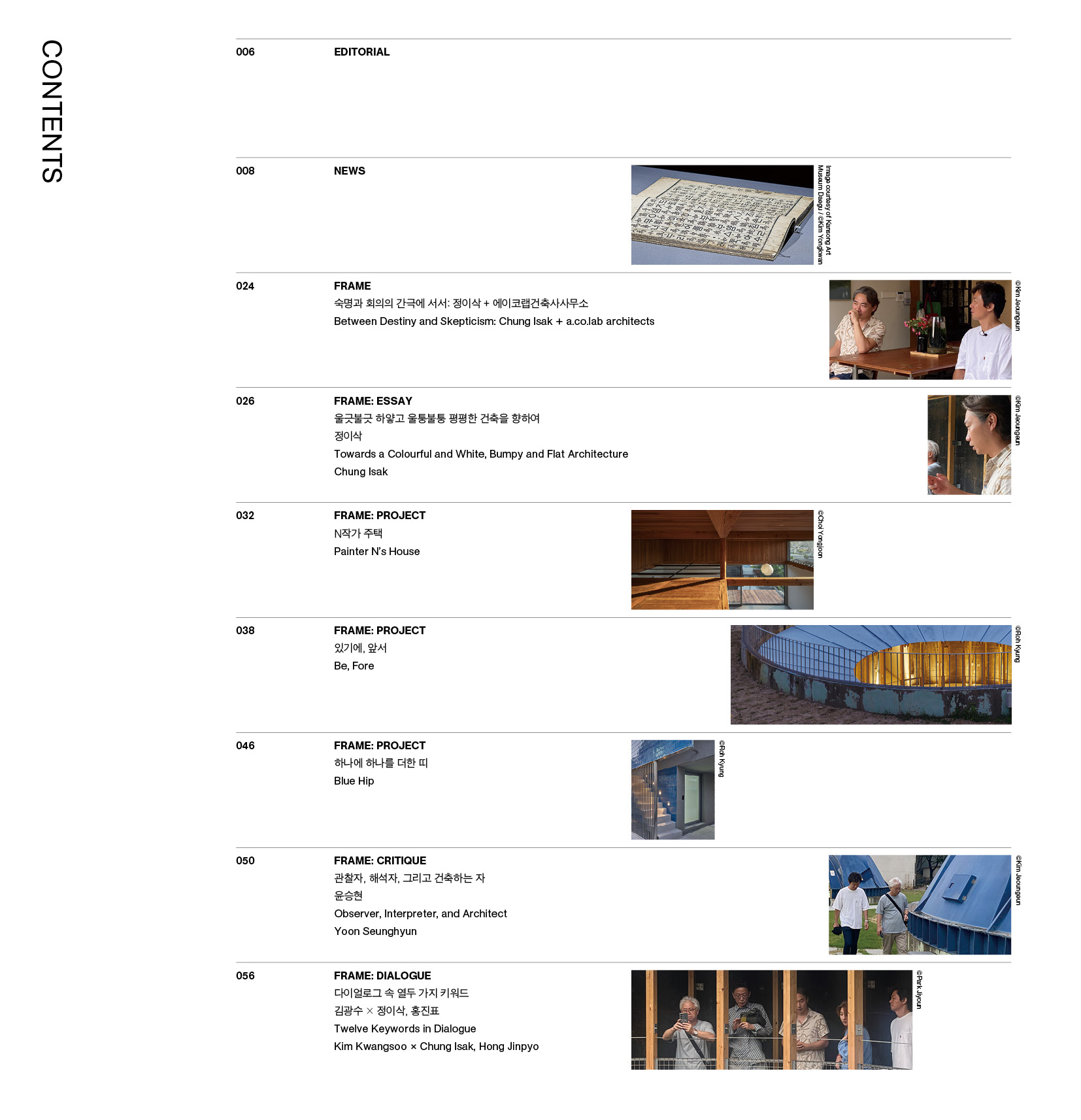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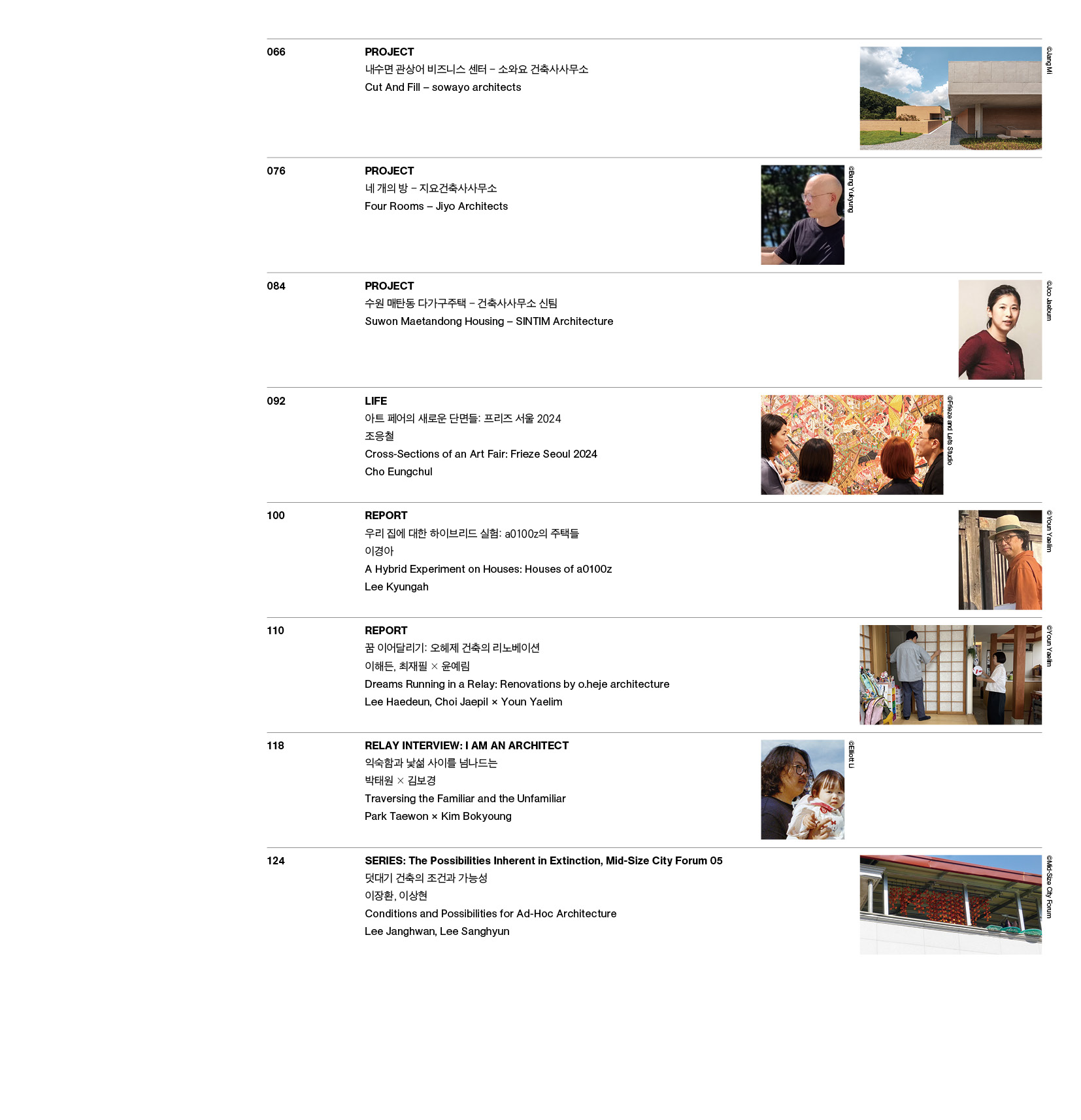
「SPACE(공간)」 2024년 10월호 (통권 683호) 목차
006 EDITORIAL
008 NEWS
024 FRAME
숙명과 회의의 간극에 서서: 정이삭 + 에이코랩건축사사무소
Between Destiny and Skepticism: Chung Isak + a.co.lab architects
026 FRAME: ESSAY
울긋불긋 하얗고 울퉁불퉁 평평한 건축을 향하여_ 정이삭
Towards a Colourful and White, Bumpy and Flat Architecture_ Chung Isak
032 FRAME: PROJECT
N작가 주택
Painter N’s House
038 FRAME: PROJECT
있기에, 앞서
Be, Fore
046 FRAME: PROJECT
하나에 하나를 더한 띠
Blue Hip
050 FRAME: CRITIQUE
관찰자, 해석자, 그리고 건축하는 자_ 윤승현
Observer, Interpreter, and Architect_ Yoon Seunghyun
056 FRAME: DIALOGUE
다이얼로그 속 열두 가지 키워드_ 김광수 × 정이삭, 홍진표
Twelve Keywords in Dialogue_ Kim Kwangsoo × Chung Isak, Hong Jinpyo
066 PROJECT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 소와요 건축사사무소
Cut And Fill – sowayo architects
076 PROJECT
네 개의 방 - 지요건축사사무소
Four Rooms – Jiyo Architects
084 PROJECT
수원 매탄동 다가구주택 - 건축사사무소 신팀
Suwon Maetandong Housing – SINTIM Architecture
092 LIFE
아트 페어의 새로운 단면들: 프리즈 서울 2024_ 조응철
Cross-Sections of an Art Fair: Frieze Seoul 2024_ Cho Eungchul
100 REPORT
우리 집에 대한 하이브리드 실험: a0100z의 주택들_ 이경아
A Hybrid Experiment on Houses: Houses of a0100z_ Lee Kyungah
110 REPORT
꿈 이어달리기: 오헤제 건축의 리노베이션_ 이해든, 최재필 × 윤예림
Dreams Running in a Relay: Renovations by o.heje architecture_ Lee Haedeun, Choi Jaepil × Youn Yaelim
118 RELAY INTERVIEW: I AM AN ARCHITECT
익숙함과 낯섦 사이를 넘나드는_ 박태원 × 김보경
Traversing the Familiar and the Unfamiliar_ Park Taewon × Kim Bokyoung
124 SERIES: The Possibilities Inherent in Extinction, Mid-Size City Forum 05
덧대기 건축의 조건과 가능성_ 이장환, 이상현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for Ad-Hoc Architecture_ Lee Janghwan, Lee Sanghyun

▲ SPACE, 스페이스, 공간
ⓒ VM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