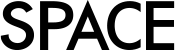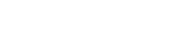「SPACE(공간)」 2025년 4월호 (통권 689호)

한국 현대건축사를 보는 렌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요즘은 지도앱을 통해 항공사진을 보는 게 흔한 일이지만, 건축 분야에서 조감사진은 사이트의 조건과 건축물의 윤곽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다. 높이와 각도 등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대상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눈높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을 보여준다. 2013년 일민미술관에서 개최된 <이득영 사진전: 공원, 한강>에는 작가가 헬기를 타고 촬영한 에버랜드 전경(‘Paradise’ 연작)이 전시됐다. 단풍이 한창인 공원의 사진은, 숲을 보여주면서도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해 땅에서 보는 풍경을 상상해보게 한다. 아카이브 북을 만드는 일은 이렇게 숲과 나무를 오가는 시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SPACE(공간)」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을 기념한 아카이브 연구의 일환으로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1996~2025』(발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오는 5월부터 개최될 베니스비엔날레 제19회 국제건축전에 맞춰 낼 예정이다. 아카이브 북에는 총 14회의 건축전 한국관 전시의 기록이 담긴다. 더불어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관의 초창기 커미셔너 인터뷰를 수록하는데, 이 인터뷰는 「SPACE」에 지난 1월호부터 선공개해왔다. 1996년 초대 커미셔너인 강석원을 시작으로, 고 김석철에 이어 세 번째 커미셔너였던 김종성, 고 정기용에 이어 다섯 번째 커미셔너였던 조성룡, 그리고 이번 호에는 여섯 번째 커미셔너 승효상의 육성을 담았다.
1996년 당시 한국건축가협회장을 맡고 있던 강석원은 초대 커미셔너를 맡으면서 한국 건축의 여러 이슈를 알리는 ‘대사’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했다. 김종성은 국제건축전의 주제를 한국의 현실에 맞춰 해석하며, 한국에서 계획되는 건축물들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조성룡은 1950년대 ‘국전’에서 시작된 건축전시의 궤적을 짚어나가며,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를 계기로 국제사회와 만나기 시작했던 맥락을 설명한다. 승효상은 여러 차례 참여했던 베니스비엔날레가 자신의 건축 여정에 미친 영향과 함께, 국제적인 네트워크 무대로서 한국관의 역할에 대해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 건축계가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는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두 건축가 김중업(1922~1988)과 김수근(1931~1986)이 타계하며, 세대교체와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였다. 당시 4.3그룹이나 건축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건미준), 서울건축학교(sa) 등을 통해 차세대 건축가들이 활동하며 2000년대 한국의 중요한 건축 프로젝트였던 파주출판도시와 헤이리 프로젝트를 이끌기도 했다. 이렇듯 건축동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건축가들은 2000년대 한국관 전시에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며 공동의 경험을 이어간다.
역대 커미셔너들은 구술기록이나 작품집, 개인전 등을 통해 이미 이런저런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그 안에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는 부연처럼 덧붙여지거나 스치듯 지나가는 이야기였다. 해외에서 진행된 전시이다 보니 실제로 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건축 작업에 비해 건축전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이번 인터뷰의 의미가 깊다. 한국 건축전시사의 초기 단계에 큐레이팅 개념이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 서사를 만드는 바탕이기에. 게다가 꽤 오랫동안, 어쩌면 지금도 세계 건축계의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건축계가 어떻게 우리의 건축적 관심사를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교류하고자 했는지 그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증언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물론 20~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편향될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전시도록이나 당대의 보도기사에서 찾기 힘든 행간의 의미를 이제서야 짚을 수 있기도 하고, 지금은 희미해진 전시에 관여했던 여러 사람들의 관계망이 떠오르기도 했다. 한국관 바로 옆에 자리한 일본관에서 재팬파운데이션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국관의 활동을 어떻게 주시했는지에 관한 에피소드도 여담으로 곁들여졌다. 5월호에는 2008년, 2012년, 2014년 건축전에 참여한 배형민의 인터뷰를 수록할 예정이다. 건축역사가이자 이론가였던 그는 건축전 참여를 계기로 건축 큐레이터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들려준다.
역대 커미셔너 인터뷰와 아카이브를 통해 한국 건축전시 역사를 되짚어본다고 생각했는데, 베니스비엔날레 역시 한국 현대건축을 이해하는 또 다른 렌즈라는 데 생각이 미친다. 이 렌즈로 관찰한 모습이 숲의 풍경을 그리는 밑그림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장 김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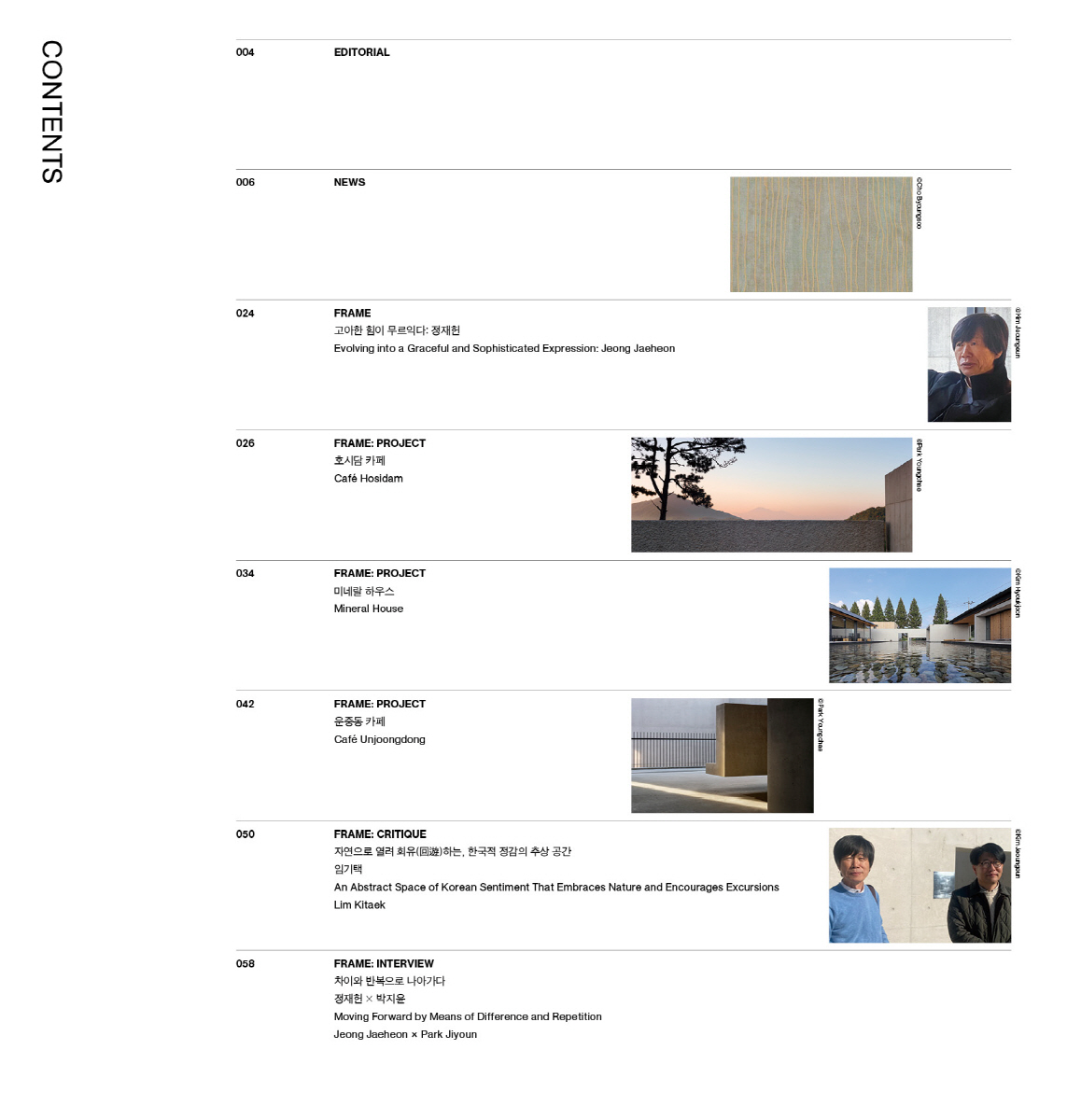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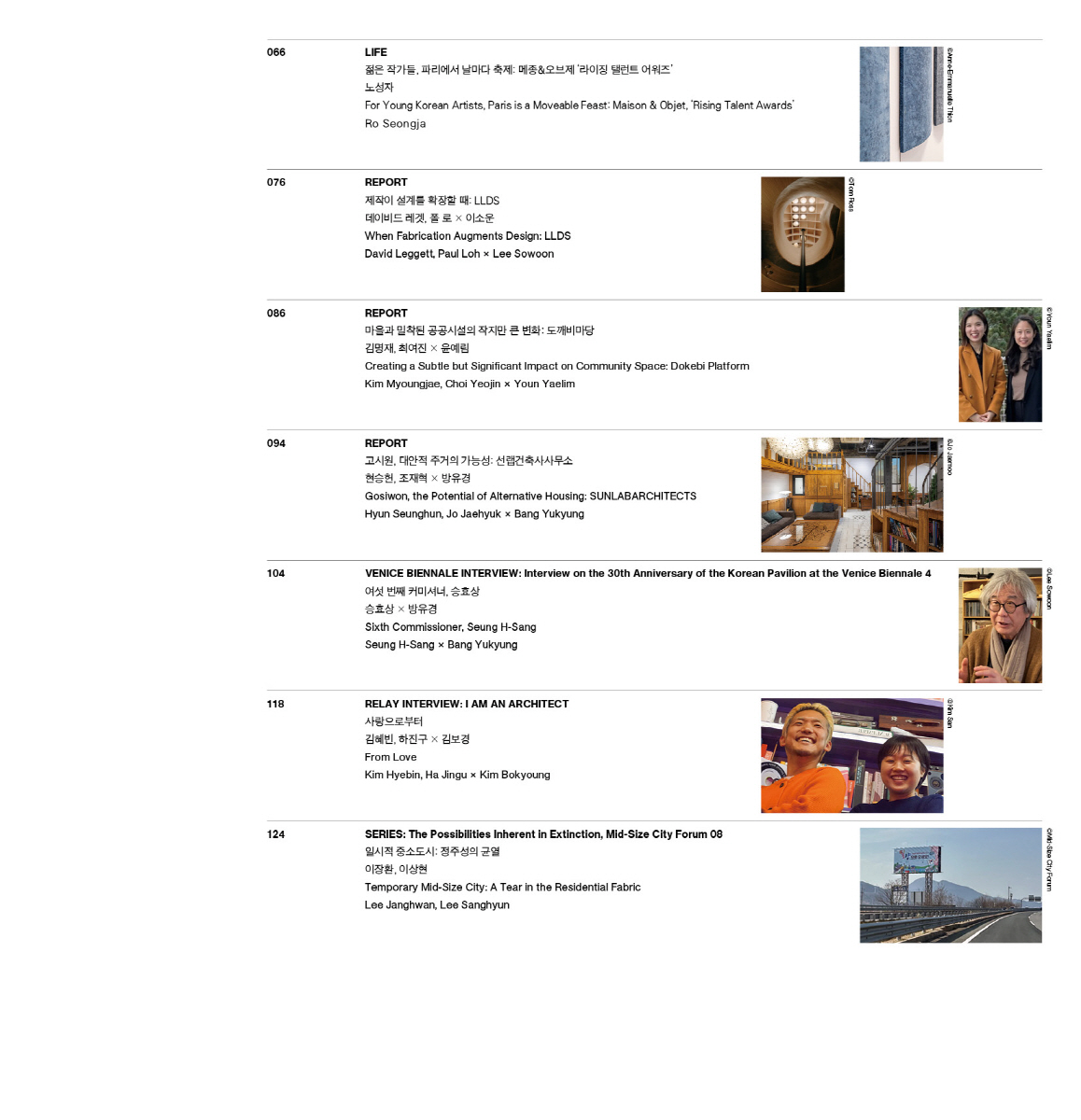
「SPACE(공간)」 2025년 4월호 (통권 689호) 목차
004 EDITORIAL
006 NEWS
024 FRAME
고아한 힘이 무르익다: 정재헌
Evolving into a Graceful and Sophisticated Expression: Jeong Jaeheon
026 FRAME: PROJECT
호시담 카페
Café Hosidam
034 FRAME: PROJECT
미네랄 하우스
Mineral House
042 FRAME: PROJECT
운중동 카페
Café Unjoongdong
050 FRAME: CRITIQUE
자연으로 열려 회유(回遊)하는, 한국적 정감의 추상 공간_ 임기택
An Abstract Space of Korean Sentiment That Embraces Nature and Encourages Excursions_ Lim Kitaek
058 FRAME: INTERVIEW
차이와 반복으로 나아가다_ 정재헌 × 박지윤
Moving Forward by Means of Difference and Repetition_ Jeong Jaeheon × Park Jiyoun
066 LIFE
젊은 작가들, 파리에서 날마다 축제: 메종&오브제 ‘라이징 탤런트 어워즈’_ 노성자
For Young Korean Artists, Paris is a Moveable Feast: Maison & Objet, ‘Rising Talent Awards’_ Ro Seongja
076 REPORT
제작이 설계를 확장할 때: LLDS_ 데이비드 레겟, 폴 로 × 이소운
When Fabrication Augments Design: LLDS_ David Leggett, Paul Loh × Lee Sowoon
086 REPORT
마을과 밀착된 공공시설의 작지만 큰 변화: 도깨비마당_ 김명재, 최여진 × 윤예림
Creating a Subtle but Significant Impact on Community Space: Dokebi Platform_ Kim Myoungjae, Choi Yeojin × Youn Yaelim
094 REPORT
고시원, 대안적 주거의 가능성: 선랩건축사사무소_ 현승헌, 조재혁 × 방유경
Gosiwon, the Potential of Alternative Housing: SUNLABARCHITECTS_ Hyun Seunghun, Jo Jaehyuk × Bang Yukyung
104 VENICE BIENNALE INTERVIEW: Interview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4
여섯 번째 커미셔너, 승효상_ 승효상 × 방유경
Sixth Commissioner, Seung H-Sang_ Seung H-Sang × Bang Yukyung
118 RELAY INTERVIEW: I AM AN ARCHITECT
사랑으로부터_ 김혜빈, 하진구 × 김보경
From Love_ Kim Hyebin, Ha Jingu × Kim Bokyoung
124 SERIES: The Possibilities Inherent in Extinction, Mid-Size City Forum 08
일시적 중소도시: 정주성의 균열_ 이장환, 이상현
Temporary Mid-Size City: A Tear in the Residential Fabric_ Lee Janghwan, Lee Sanghyun

▲ SPACE, 스페이스, 공간
ⓒ VM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